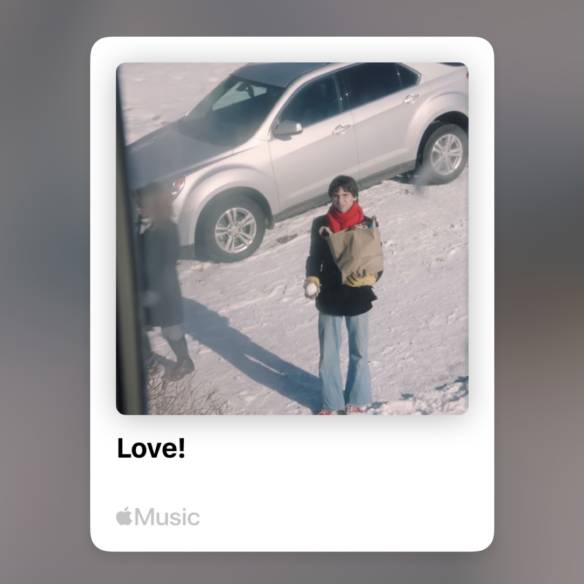한국 나이 스물 아홉, 바자라는 여자를 만나다.
하퍼스 바자 코리아와의 가상 인터뷰
전체 페이지를 읽으시려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주세요!
바자라는 여자
겁 없고, 지적이고, 불손하며, 섹시하고, 예측할 수 없는 여자. 그녀의 한국 나이는 스물아홉. ‘하퍼스 바자 코리아’라고 불리는 어떤 여자와 가상의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
에디터 당신을 처음 본 날을 기억해요. 1996년, 어느 서점이었죠. 케이트 모스의 얼굴을 한 당신은 블랙 스윔웨어를 마치 드레스처럼 우아하게 입고서 꼿꼿하게 서 있었어요. 그때부터 줄곧 묻고 싶었어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퍼스 바자 저는 질문이에요.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이 세계에서 여자로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그런 물음을 패션과 예술, 문장과 이미지로 풀어가죠. 1867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지만, 한국 나이로는 스물아홉이고요.(웃음)
에디터 동안이시군요.(웃음) 그런데 제 궁금증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네요. 보다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은 잡지인가요, 사람인가요?
하퍼스 바자 둘 다예요. 나는 종이 위에 존재하지만, 동시에 감각의 형태로도 존재해요. 누군가는 나를 펼치고, 누군가는 나를 스크랩해요. 어떤 날은 당신의 거울 앞에, 어떤 날은 침대 머리맡에 있고 또 어떤 날은 휴대폰 속에 있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형태로든 살아 있는 셈이죠.
에디터 스스로를 어떤 여성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까지 당신을 만난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인상으로 당신을 회고한다는 사실이 흥미롭거든요.
하퍼스 바자 <바자>의 전성기를 이끈 편집장 리즈 틸버리스의 말을 빌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바자>에서 다루는 기사는 겁이 없고 지적이면서 불손하고 섹시하며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것이어야 한다”. 말하자면 저는 하루에 대여섯 번은 성격이 바뀌는 여자예요.(웃음) 어떤 날은 철학적이고, 어떤 날은 도발적이죠. 시를 쓰다가 경제 기사를 읽기도 하고, 때로 뮤즈를 만나면 온 마음을 빼앗기기도 한답니다.
에디터 패션에 대한 당신의 열정은 세상에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당신에게 패션이란 단순히 옷에 그치는 건 아닐 거라 짐작합니다. 패션에 대한 당신의 철학을 듣고 싶어요.
하퍼스 바자 어떤 사람은 붉은 립스틱 하나로 자신감을 드러내고, 어떤 사람은 낡은 데님 팬츠로 정체성을 보여주죠. 패션은 언어보다 빨라요. 입는 순간 말하게 되니까요. 저에게 패션은 태도예요. ‘나는 이런 모습으로 세상과 마주하겠다’는 선언이자, ‘이게 나야’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방식이죠.
에디터 당신은 패션뿐만 아니라 문학 애호가이기도 합니다.
하퍼스 바자 전 미국에 살 때부터 찰스 디킨스, 앤서니 트롤럽, 토머스 하디, 헨리 제임스 그리고 버지니아 울프를 탐독했어요. 1930년 1월 미국에서 읽었던 버지니아 울프의 첫 번째 단편소설 ‘In the Looking Glass’를 2017년에 한국의 친구들에게 소개하기도 했고요. 사람들은 버지니아가 신작을 패션 잡지에 기고했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합니다. 그녀가 이지적인 삶을 살며 외모에는 무관심했을 것이라고 속단하죠. 하지만 알고 보면 그녀는 일상 속의 디테일, 그중에서도 특히 옷에 큰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저의 지향점과 비슷하달까요? 저는 패션과 예술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일에 관심이 많죠. 그리고 이것은 결국 지적이고 감상적인 글을 통해 가능하다고 믿어요. 제가 만드는 화보나 기사도 결국은 그런 문학적 감수성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해요.
에디터 아까 밝혔듯 한국 나이로 올해 스물아홉입니다. 이십대의 마지막 생일을 어떻게 보낼 계획인가요?
하퍼스 바자 저를 매달 읽어주는 독자들, 이렇게 푹푹 찌는 날씨에도 최고의 한 컷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밤을 새워 글을 쓰는 동료들, 그리고 언제나 저에게 영감을 주는 아티스트들과 함께하고 싶네요. 그들과 와인잔을 부딪히며 축하할래요. 아, 그날 밤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붉은색 드레스를 입어야겠어요.
에디터 뉴욕에서 태어난 당신이 지금처럼 서울에 완벽히 정착하기까지 매달 새로운 도전이었을거라 생각해요. 지난 29년을 잘 스스로에게 격려의 말을 남긴다면요?
하퍼스 바자 솔직히 말하면… 맞아요, 저 꽤 잘해왔어요.(웃음) 시대의 유행이 어디로 흐르는지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렸어요. 그저 얼굴만 예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고, 진짜 언어와 이미지로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닿게 하려고 애썼고요. 누군가에게는 첫 영감이, 누군가에게는 오래된 친구가 되고 싶었죠. 문득 몇몇 장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요. 사울 레이터의 사진에 영감받아 서울 곳곳을 포착했고, 21팀의 디자이너와 함께 각자의 철학과 해석이 담긴 21개의 화이트 티셔츠를 만들기도 했죠. 스물다섯 번째 생일엔 스물다섯 벌의 표지로 옷을 갈아입고 성대하게 축하를 받았어요. ‘바자전’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2년 연속 현대미술 전시도 개최했어요. 당대 가장 뜨거운 인물들도 만났습니다. 2007년엔 20명의 신진 디자이너 중 한 명으로 미리 킴 존스를 낙점했던 기억이 나는군요. 백남준, 박서보, 헬무트 랭, 데이비드 린치, 칼 라거펠트…. 그러고 보니 지난 29년 동안 정말 수많은 얼굴을 마주했네요.
에디터 그중에서도 특별히 기억에 남는 얼굴이 있나요?
하퍼스 바자 너무 많아서… 한 사람만 꼽기란 쉽지 않지만 그래도 먼저 떠오르는 이들이 있어요. 첫 영화 <접속>이 개봉할 당시에 만났던 스물넷의 전도연이나 이제 막 데뷔한 신인 아이돌이었던 BTS는 맑은 눈으로 자신의 꿈에 대해 말했어요. <바자>와 시작을 함께한 톱모델 송경아, 한혜진, 김원경과는 20년 뒤에 다시 만나서 기념 화보를 찍기도 했어요. 시간 속에서도 완전무결한, 날것 그대로도 아름다운 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요. 이들은 모두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데 주저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언제, 어느 때나 그들 자신이었죠.
에디터 <바자>의 1960년대 아트 디렉터 루스 앙셀은 “잡지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비추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만 오늘날, 혹자들은 종이 잡지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하퍼스 바자 그럴 리가요. 지금 당신 앞에 제가 이렇게 살아 있잖아요?(웃음)
에디터 당신의 독자, 그러니까 당신의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하퍼스 바자 1930년대 편집장 카멜 스노가 말했죠. “<바자>는 제대로 입고 제대로 아는 여자들을 위한 잡지다.” 이들이 제 친구들입니다.
Credit
- 사진/ Harper’s Bazaar December 1959 Richard Avedon
- 디자인/ 한상영
- 디지털 디자인/이주은
Celeb's BIG News
#블랙핑크, #스트레이 키즈, #BTS, #NCT, #올데이 프로젝트, #에스파
이 기사도 흥미로우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