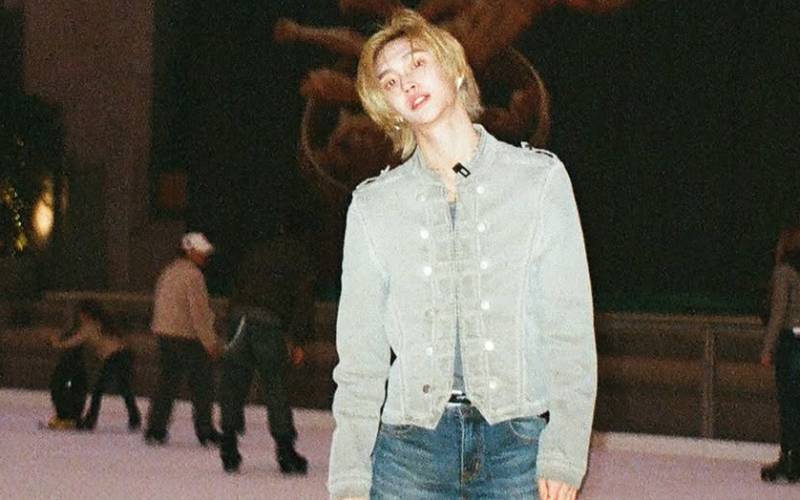'나무의 시간'을 탐구하는 건축가 박희찬
2025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에서 세 가지 건축적 디바이스를 통해 놀이처럼 한국관을 탐험하게 만든다.
전체 페이지를 읽으시려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주세요!
박희찬
건축적 디바이스를 고안하거나 전시를 기획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활동하면서 건축가의 역할을 모색해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관의 정체성을 <나무의 시간>으로 해석해 한국관이라는 무대로 관객을 초대한다.

박희찬은 2018년 스튜디오 히치를 설립한 후 산양양조장 리모델링 프로젝트로 2020년 한국건축가협회상을 수상했다. 그의 대표작인 산양양조장은 과거의 역사와 축적된 시간을 유지하되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양조장 기능을 상실한 채 버려진 장소가 건축가의 적극적인 개입 하에 보존과 복원이 조화를 이룬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도시재생의 모범이 된 산양양조장이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지속 가능한 건축으로 생명력을 얻었다면, 2022년 설계한 제주도 중문성당 포스리하우스는 아픈 역사(제주 4·3 사건)를 지닌 땅에 상처를 보듬는 치유의 시간을 선사했다. 포스리하우스의 아담한 화장실에선 아름다운 바닷가 풍경을 보면서 손을 씻는 짧은 행위 자체가 치유를 위한 의례가 된다.
스튜디오 히치는 건물 설계뿐만 아니라 산업디자인, 건축 재료 연구, 전시 기획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박희찬은 위대한 장인들의 정신과 행보를 따르듯 건축가가 지닌 감각을 강조한다. “건축가의 근본적인 감각은 뭘 만드는 거죠. 우리 스튜디오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는 건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예전처럼 몰드를 만들거나 톱질을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 시대는 어떻게 코디네이션을 하는지가 결국 만드는 거죠. 그 중심에서 건축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2021년 서울도시건축전시관 공모전에 당선되어 서울마루(옥상 공간)에 다양한 재료와 질감을 공감각적으로 즐길 수 있는 놀이터 <서울어반핀볼머신>을 설치했고, 국립현대미술관의 «젊은 모색 2023: 미술관을 위한 주석»을 위해 마블 머신의 원리를 활용한 <리추얼 머신>을 제작한 것처럼 구조적이고 건축적인 장치에 대한 애정도 강하다. 잊지 못할 성과는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작년 여름에 선보인 «서펜타인 파빌리온의 순간들 2000-2024: 모두를 위한 영감의 공공 공간»에서 전시 공간 설계를 맡은 일이다.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의 정체성과 높은 층고를 지닌 비움홀을 절묘하게 활용한 전시였다. 독특하게도 이 전시관 입구에는 문이 없다. 지나가는 외부인을 자연스럽게 내부로 유입한다. 즉 전시관의 공간을 도시 내부 속의 광장처럼 만들겠다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투명하고 가벼운 천막을 설치했다. 천막의 뾰족한 모양과 멤브레인의 부드러운 곡선이 시선을 사로잡았고 각양각색의 서펜타인 파빌리온들을 품으며 축제의 풍경을 빚어냈다.
박희찬은 스튜디오 히치의 작업이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모든 프로젝트 안에는 숨은 이야기가 있다. 그가 작업한 산양양조장이나 포스리하우스처럼. 그의 건축 철학에 따르면, 이야기를 잘 조율해서 전달하는 사람이 곧 건축가다. 그렇다면 박희찬은 한국관이 들려주는 어떤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을까? 무엇보다 주변과의 경계가 흐린, 열린 공간의 속성에 주목했다. 다른 국가관의 공간이 화이트 큐브인 반면 한국관은 작품이 주위 환경이나 시간 안에서 경험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렇게 시간 안에서 경험되는 공간을 반영해 <나무의 시간(Time for Trees)>을 착안했다. 건물과 주변 환경(나무들)의 경계를 탐험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로 세 개의 건축적인 디바이스를 제작했다.
<그림자 감지 장치>는 관람객이 한국관 주변의 나무들이 드리운 그림자를 체험할 수 있는 설치물이다. 패브릭으로 만든 스크린에 바깥에서 들어오는 나무 그림자가 맺힌다. 낮과 밤, 계절과 기후 조건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나무들이 만들어내는 그림자의 패턴, 음영, 심지어 미묘한 움직임까지 포착한다. 나무와 그림자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좁다란 공간 안에서 체험할 수 있다. 한국관 전시장 중앙과 외부에 설치된 <자르디니 건축 여행자>는 쉽게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모듈러 트러스다. 용도에 따라 사다리, 벤치, 전망대 같은 플랫폼이 되고, 쌓으면 행사를 위한 무대나 전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베니스비엔날레를 방문하는 미술 애호가들이 마치 순례자처럼 고단한 일정을 감내하면서 예술계 의례에 참여하는 여행을 환기하는 차원도 있다. 커다란 잠망경 형태의 <엘레베이티드 게이즈 1995>는 인간의 시선이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주변 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상태를 상정한다. 잠망경의 메타포를 차용했을 뿐 360도 회전 카메라가 달려 있다. LED 모니터로 보면서 작동이 가능하고, 마이크로 바람이나 새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관람객이 직접 잠망경을 돌려가면서 건물과 나무의 경계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너머의 바다도 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 세 작품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시퀀스처럼 작동하면서 한국관의 주변 환경을 관찰하고 탐색하게 만든다.
직접 드러나진 않지만 박희찬의 작품은 건축적인 공간 혹은 설치작업에서 세팅이 무대 장치로 기능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의 작품은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배우와 응시하는 관객을 상정한다. 그가 만든 장치를 통해 관객이 배우가 되고, 어느 순간 배우가 관객이 되기도 한다. 도시라는 큰 범위 안에서 바라보면, 건축가가 만든 오브제들이 배경이 되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배우이자 동시에 관객이 되어 만드는 것이 결국 도시 이야기이다. 의외의 해프닝이 일어나면서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는 것은 늘 흥미진진하다. 그가 건축가로서 소통하고 창안해온 이야기들이 바로 <나무의 시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Credit
- 글/ 전종혁
- 사진/ 김형상
- 헤어&메이크업/ 장하준
- 디자인/ 한상영디자인/ GRAFIKSANG
2025 겨울 패션 트렌드
#겨울, #윈터, #코트, #자켓, #목도리, #퍼, #스타일링, #홀리데이
이 기사도 흥미로우실 거예요!